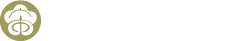인물정보
송몽인(宋夢寅)
송몽인은 유고집으로 『琴巖集』 1책이 있다.
금암공은 송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인 양지뜰(양지말)에 살았다. 송촌동에서 비래동으로 가는 길옆에는 비래암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이 곳을 지나 동춘당 앞으로 해서 중리동으로 흐른다. 그런데 송촌과 양지말 사이의 냇물은 커다란 바위로 깔려있고 더러는 원두막 크기의 판판한 바위도 있어 거기에 앉아 시를 읊거나 거문고를 타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다. 바위 군(群)위에는 돌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琴巖(금암)」이라 새겨져 있다.

송몽인 유고집『琴巖集』 |
이 돌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송촌에서 양지말로 가는 길의 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1988년 시냇물 돌 위에 얹혀 있다가 1995년 송촌 택지개발 사업 때 현 소대헌 고택 앞으로 옮겼다. 금암(琴巖)의 호는 이 돌에서 유래되었다. 그 사실은 우암선생이 지은 효정공 묘표에 있는데 “……마을 위에 금암(琴巖)이 있는데 냇물이 지대가 더욱 상쾌한 고로 증 참판 진사 휘 몽인이 여기에 거주하여 자호로 하였고, 『금암집』 1권이 세상에 간행되었다. 아들이 없어서 재종형 희명의 둘째 아들 국택으로 후계를 하였다.” 송몽인은 선천적으로 재주가 뛰어나서 7세부터 글을 짓기 시작하여 좀 자라서는 격조 높은 글을 지었으나 31세에 세상을 떠났다. 시집 『금암집』이 있는데 1625년 민씨 부인과 사우당이 유고를 수집하여 편집했으며, 그것을 교정하여 서문을 쓴 분은 민부인의 외숙인 지봉 이수광이며, 발문을 쓴 분은 동회 신익성이고, 그것을 손수 써서 목판에 새기게 하여 비래암에 보관한 분은 죽창 이시직과 비래암 스님 지숭이다. |
광해군 8년(병진 : 1618) 봄에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그 후 고종 26년(1889) 후손 송병준(개명하여 송병화)이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처음 간행한 책에는 시 150편과 계(啓) 1편이 수록되었으나 중간본에는 묘명(墓銘), 유사, 부인 민씨의 만사(輓詞) 등을 증보하였다. |
|
- 1) 춘애(春崖)는 송문창이니 은진송씨 쌍계당파이다. 자는 태지요 춘애는 그 호이다. 萬曆壬午(1582)에 사마양시에 합격하였다. 『은진송씨 정해대보』, 『은진송씨 쌍계당파보』
- 2) 송몽인, 1986, 『琴巖集』, 恩津宋氏四友堂孝貞公宗中, P79-P81
- 3)김선기, 2009, 「대전의 옛 시가」, 『대전문화』, 대전광역시, p95~p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