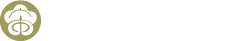인물정보
송남수(宋柟壽)
가. 생애
송남수(중종 32, 1537∼인조4, 1626)의 자는 영노(靈老) 호는 송담(松潭) 본관은 은진이다. 쌍청당 송유의 5대 주손으로 안악군수 송세훈의 3남2녀 중 장남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당시 宋村)에서 출생하였다.16살 때 부친상을 당하자 그는 당시 목사공 요년 등 산소가 있었던 상사한리 인근의 하사한리에 안악공을 입장(入葬)하였다.

효자 선교랑(孝子 宣敎郞) 송경창(宋慶昌) 묘역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
그 과정에서 단양 우씨 등 선주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들을 간곡하게 설득시켜 묘소를 쓸 수 있었다. 19살 때 전의 이씨와 혼인하였으나 자녀 없이 일찍이 상처하였고, 다시 2년 뒤 진주 유씨와 가약을 맺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공은 쌍청당의 풍모를 닮아 자연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가졌다. 28세 때 쌍청당과 절우당을 수축하였다. 절우당은 쌍청당 서쪽에 있다. 곧 공의 막내 삼촌 세협(자산공)이 지은 것인데, 공이 수축하고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를 심어 "절우(節友)"라 명명하고 정곤수 등 여러 사람에게 시와 기문을 청하였으며, 또 16영이 있어 한때의 명사들이 시를 짓고 화답한 것이 많다. 또 60세 때의 기록에는 “절우당에 시를 지어 걸었다.”고 되어있다. |
|
42세 때 처음 벼슬하여 사포시 별제가 되었다. 이후 의영고 직장, 상의원 주부, 사헌부 감찰을 거쳤다. 나. 숭현서원 중수 숭현서원은 1583년경 정광필·김정․송인수 등 3현을 모시기 위하여 대전 용두록에 건립된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그러나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소실된 서원을 다시 복설한 것은 17년 후 1609년 송남수에 의해 이루어졌다.5) 이 중수를 위해 송남수와 같이 힘을 합쳤던 인물로는 청좌와 송이창이다. 송남수와 송이창은 재종질간으로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지만 뜻을 함께 하여 향촌과 문중 대소사를 의논했다. 이시직은 1609년 3월 삼현을 모신 이 서원을 사액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려, 그해 6월 숭현(崇賢)이라는 사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시직은 조부 이정현이 송준길의 증조부 송세영의 사위가 된 것을 인연으로 하여 회덕에 와 살고 있었다. 그는 뒤에 조정에 나가서 벼슬이 사복시 정(정3품)에 이르렀는데, 1636년 강화로 피신하였다가 회덕 출신의 송시영과 함께 자결한 절의의 인사였다. 숭현서원 낙성한 후에 송남수는 윤근수와 이호민 그리고 신흠에게 기물을 청하는 한편 서원 부근의 전답을 매입하여 서원에 배속시켰다.6) 송남수가 중심이 되어 서원이 건립되었을 때 서원 구내에는 묘우만 있었을 뿐 선비들의 학문 연마 공간인 강당은 아직 세워져있지 않았다. 숭현서원의 강당인 입교당(立敎堂)은 송이창이 여러 유생을 거느리고 건립했다. 그는 서매부 서양갑이 계축화옥에 연루된 일로 인하여 벼슬길에 물러난 뒤 1613년부터 회덕에 내려와 있었다.7) 건물이 완성되자 송남수는 입교당의 전액(篆額)과 시를 써서 설주에 달게 하였다.8) 입교당위의 전액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의 숭현서원에 대한 강렬한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 쌍청당·절우당 중수 1432년 쌍청당 송유에 의해 건립된 쌍청당은 회덕과 은진송씨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1차는 송남수의 조부 송여림에 의해 1524년에 중수되었다. 이때 눌재 박상이 기문을 지어주었다.9) 2차 중수는 1차 중수이후 40년 만인 1563년에 이루어졌다.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화로 쌍청당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터에는 가시덤불만 남게 되었다. 쌍청당이 재건된 것은 20년의 시간이 흐른 1616년이었다. 청좌와 연보에 보면, 이 해 10월에 여러 친족과 모여 쌍청선조에게 제사를 지냈다. 송담공이 쌍청당을 중창하고 모든 일가들을 모이게 하고 제사를 올리고 낙성하였다.10) 송남수는 고을 일가들의 후한 원조를 얻어서 당우를 복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자 속에 보관해두었던 쌍청당 현판의 글들은 김현성이 다시 쓰고, 자신이 전액을 써서 당미(堂楣)에 걸었다. 쌍청당은 그 뒤 몇 번 더 중수되었지만 김현성의 글씨로 만든 현판들과 송남수의 쌍청당 전액은 지금도 그곳에 걸려있다.11) 그 뒤 그는 1564년 절우당을 수축하였다. 절우(節友)란 봄날의 매화, 여름철의 대나무, 가을의 국화, 겨울의 소나무를 말하는데 모두 절개를 지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절개를 벗 삼는다는 뜻이다. 그 후 송남수는 여러 지인들에게 절우당 시를 부탁했는데 정곤수와 송찬, 이해수의 시가 남아있다.12) 라. 松潭集 송남수(1537~1626)는 유고집으로 『송담집』을 남겼다. 이 책은 그의 후손인 송국사 송규창 송규렴 송상기 등이 자료를 수집하여 1686년(숙종 22)에 펴낸 책이다. 서문은 우암 송시열이 쓰고, 발문은 농암 김창흡이 썼다. 그 후 1968년에 4권2책으로 중간하고, 1980년 1997년 2회에 걸쳐 번역본 『국역 송담집』을 발행한 바 있다.『송담집』의 내용은 검신요결, 서(序), 기(記), 등과 부록으로 연보(年譜), 가장, 묘지, 묘갈명과 습유(拾遺)등이 있으나 대부분 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 가운데는 오언절구 32편, 칠언절구 171편, 오언율시99편, 칠언율시 134편, 오언배율 2편, 오언고시 2편 등 모두 441편이나 된다. 가장 알려진 시는 「松潭偶吟」으로 남용익의 ‘箕雅’에 소개되어있는 시다. 松潭偶吟 石嶺春猶早 沙村雪未消 鵑蹄溪上月 人斷柳邊橋 野老偏憂國 山戎久據遼 西征健兒盡 閭巷日숙條 송담에서 우연히 읊다 석령에 봄이 일찍 찾아왔건만 사라니엔 아직 눈이 녹지 않았네. 달밤에 개울에서 두견새 우는데 버들가 다리에는 인적이 끊겼구나. 시골 노인들은 오직 나라 걱정뿐인데 산간오랑캐는 요동 땅에 오래도 머무누나. 서쪽 변방 정벌로 건아들이 남지 않아 마을 거리는 날마다 쓸쓸해지네. 그의 한시 가운데 두 편을 소개한다. 手裁三樹近瞻端 苦節須從雪襄看 獨抱瑤琴淸坐久 月移疎影上彫欄 매화 세 그루를 손수 심었더니 자라서 처마 끝에 가까이 있네 고생을 무릎 쓴 그의 절개를 모름지기 눈 속에서 보아야 하니 나 홀로 요금(瑤琴)을 안고 맑은 마음으로 앉은 지 오래로다 성긴 달 그림자를 달빛이 옮겼다가 조각난 난간위에 얹어놓도다 (송담 송공 유적대관에서) 이 시는 송담이 절우당을 수리하고 주위에 송죽매란(松竹梅蘭)을 심고 지은 절우당 팔영 가운데 첫 번째 시 매화이다. 눈속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는 사군자의 기품을 통하여 선비의 마음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하겠다. 逸勢雄南紀 神功鎭海東 川聲走白石 秋色染丹楓 身落紅塵窟 魂遊碧霧中 上方何日夕 焚麝一樽同 우뚝한 형세는 남방에 제일이고 조물주의 공력은 해동을 진압했네 냇물소리는 흰 돌 위를 달리고 가을빛은 단풍을 물들었네 몸은 세속 굴에 떨어졌으나 혼은 푸른 안개 중에 노닐고 있네 저 높은데서 어느 날 저녁에 향을 사르며 술 두르미 같이 하나 대둔산 기행(국역 송담집에서) 송담은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서 여행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즐긴 시인이었던 같다. 그러므로 송담의 시 가운데는 여행 중에 쓴 기행시가 참으로 많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풍광을 노치지 않고 시로 옮겼다. 앞의 시는 송담이 대둔산을 관광하고 이여인(李汝寅)등 여러 친구들에게 바친 글이다. 대둔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대둔산에서 느낀 감회가 잘 표현되어있다. 송남수는 특히 재종질되는 송이창과 지정(至情)으로 교류를 많이 하였다. 그는 세 명의 아우가 먼저 사망한 연고로 그를 동생처럼 사랑했다. 송이창이 조정의 교지를 받고 한양으로 떠나는 날 그 행차를 송별하며 다가오는 추사(秋社)에는 누구와 술잔을 나누어야 하나 아쉬워했고, 읍호정을 세우자 자주 그곳을 방문하여 시를 짓고 노닐었으며, 계룡산과 형강(荊江)13), 갑천 등지의 산수를 소요하며 회포로 시를 읊고 화답하였다. 또한 종족들과 큰 야유회도 여는 등 문중일도 같이 협력하며 숭현서원 중수 등 향촌사회 질서유지에도 앞장섰다.14) 송이창과 교류내용 두 가지를 소개한다. 78세 때, 가을에 청좌와 송공으로 더불어 계룡산에서 놀았다.16) 청좌공이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여 서로 사랑함이 더욱 두터웠다. 매양 장구(杖屨 : 지팡이와 신발로 노니는 것의 간접적인 표현)가 지나는 곳에 따라 산수 간을 소요하며 회포를 시로 읊고 화답하였다.15) 81세(1617)때에 봄에 읍호정에서 놀았다. 청좌와공이 현의 서쪽 갑천의 상류 황수촌(皇穗村)에 읍호정(挹灝亭)을 지었다. 뒤에 공이 제시(題詩)하여 붙였다.17) 이에 이르러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곳에서 유숙하고 돌아왔다. 숭현서원 입교당이 준공되었다. 당시 숭현서원 원장이던 송이창의 주도로 입교당(入敎堂)이 준공되자 전액(篆額)과 시를 써서 걸었다.18) 崇賢講堂 初成喜甚 錄呈院長賢契 松衫秘棟宇 丹碧炫朝暾 門對鷄山月 簷連甲水雲 紫宸新額下 白鹿舊規存 衛道誠心切 堂成會以文 숭현강당이 처음 낙성되자 매우 기뻐서 글을 지어 원장 현계19)에게 드리다. 소나무 삼나무가 서원 집을 가려서 단청의 그 빛이 찬란하네 문은 계족산 달을 대하고 처마는 갑천의 구름에 연했도다 대궐에서 새로운 액이 내리니 백록동의 옛 규모 남아 있구나 도를 호위하매 성심이 간절하니 당이 낙성하여 글로써 벗을 모으다
|
|
- 1) 송봉기 가에 소장되어있다고 한다.
- 2) 송남수, 1997.12, 「續集附錄 拾遺條」, 『國譯松潭集』, 恩津宋氏松潭公宗中 향지문화사, p424
- 3) 2001년 10월 31일 복설하였다.
- 4) 송성빈, 2018. 7. 1, 「쌍청당을 잘 보전해준 송담공」, 『은진송씨종보 제165호』, 은진송씨대종회
- 5) 송인협, 1997,「숭현서원에 대한 연구」, 『대전문화 제6호』, 대전광역시, p335~p385
- 6) 송남수, 1997.12, 「續集附錄 年譜」, 『國譯松潭集』, 恩津宋氏松潭公宗中, 향지문화사, p383
- 7) 송이창, 1994, 송준길 「家狀」, 『淸坐窩 遺稿』, 향지문화사, P193
- 8)송남수, 1997,「續集附錄 年譜」 81세(丁巳), 『國譯松潭集』, 恩津宋氏松潭公宗中향지문화사, p390
- 9) 앞의 책, 「雜著 : 雙淸堂記文」, 恩津宋氏松潭公宗中 향지문화사, p318~p319
- 10) 송이창, 1994, 송준길 「年譜」 『淸坐窩 遺稿』 향지문화사, P174
- 11) 송현강, 2013,「송담 송남수와 향촌사회」, 『대전문화』, 대전광역시, p214~p215
- 12) 송남수, 1997,「續集附錄 송영노의 회천 절우당에 제하는 시 아울러 서문도 쓴다.」, 『國譯松潭集』, 恩津宋氏松潭公宗中 향지문화사,p4~443, p451
- 13) 회덕 북쪽을 지나는 금강의 별칭
- 14) 송현강, 2013,「송담 송남수와 향촌사회」, 『대전문화』, 대전광역시, p213~p219
- 15) 송남수, 1997,「續集附錄 年譜」 78세(甲寅), 『國譯松潭集』, 恩津宋氏松潭公宗中 향지문화사 p388
- 16) 읍호정에서 송이창과 만난 기록은 연보에 89세때인 1625년 5월에도 만난 기록이 보인다.
- 17) 읍호정은 송이창이 오래전부터 있던 정자를 수리하고 일대의 밭과 산을 사서 조경한 정자이다. 읍호정이란 이름도 현감 조경란이 붙인 것이다. 송남수는 『해동산천록』에서 회덕의 명소로 읍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읍호정은 회덕현 서쪽 1리에 있다. 현감 송이창이 지었는데 높은 언덕이 우뚝 솟았다가 끊어진 곳에 있다. 앞에는 큰 들판을 임하였고, 긴 내는 10여 리나 된다. 천 그루의 푸른 소나무는 처마를 끼고 서늘한 기운을 내며 동으로 학악(鶴岳)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계룡봉우리를 떠받드는데 아침저녁으로 흐렸다 개었다하여 기운을 내며 기상이 천태만상이다. 정자에 20영이 있다. 81세때 읍호정에서 유숙하면서 송이창에게 써주었다는 연보의 기록은 「송복여의 읍호정에 글을 지어 부치다(의제송복여읍호정)」 『海東山川錄』에 있는 두수가 아닌가 싶다. 읍호정 구허는 지금의 숭현서원 건너편 원촌교 다리지나 세종으로 가는 갑천 우안 도로 위 산이 된다.(필자가 고 송파 송용재 씨가 살아있을 때 답사) 읍호정에 대한 시는 읍호정, 읍호정 12경 등 문집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 18) 송남수, 1997, 「詩 : 七言絶句 171首」78세(甲寅), 『國譯松潭集』, 恩津宋氏松潭公宗中, 향지문화사, p164
- 19) 자기보다 연하의 벗을 존경하여 일컫는 말, 당시 원장이던 청좌와 송이창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