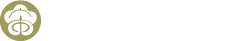인물정보
송치규(宋穉圭)
우암문정공파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 묘역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 |
송치규(宋穉圭)는 자가 기옥(奇玉)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강재(剛齋)는 호이다.
증 판서공(判書公) 환명(煥明)과 평산신씨(平山申氏) 사덕(思德)의 따님 사이에 1759년
(영조 35) 4월 18일에 안동 구담리(安東 九潭里) 외가에서 태어났으니 송시열의 6대손
이다. 처음 태어났을 때 형체와 용모가 단아하고 수려하여 눈에서 광채가 났다고 한다. |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 묘비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 |
1804년(순조 4)에는 군자감정(軍資監正), 이듬해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1812(순조 12)에는 세자시강원 진선(世子侍講院 進善), 공조참의(工曹參議), 1815년(순조 15)에는 시강원 찬선(侍講院 贊善), 공조참판(工曹參判), 이듬해에는 대사헌(大司憲)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당대의 거유(巨儒)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
송치규는 송시열(宋時烈)의 후손(後孫)으로, 젊은 나이에 김정묵(金正默)에게 배웠다.
김정묵은 호(號)가 과재(過齋)로서 경술(經術)과 품행과 재능이 있었는데, 김두공(金斗恭)의 수사율(收司律)에 연좌(連坐)되어 죄를 받아 유일(儒逸)의 적(籍)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송치규가 스승의 무함(誣陷)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여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대신(大臣)의 진달로 김정묵의 관직(官職)을 회복시켜 송치규가 사진(仕進)할 길을 열어 주었으나, 송치규는 더욱 굳게 뜻을 지키면서 스스로 몸을 닦고 곤궁함을 견디며 학문에 힘썼는데, 늙어서는 더욱 독실하였다.
1839(헌종 5)년 12월 : 임금이 예랑을 파견하여 조문하고 슬퍼하며 제물을 하사하고 사제문(賜祭文)을 내리다.
1841(헌종 7)년 정월 : 대신 조인영이 임금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아뢰니 특명으로 시장없이 문간(文簡)으로 시호(諡號)를 내리다.
문간(文簡)의 의미는 문(文)은 도덕이 있고 널리 들은 것이 많으니 도덕박문(道德博聞)이고, 간(簡)은 덕으로 일관하고 마음이 헤이하지 않은 것의 일덕불해(一德不懈)이다.
[『헌종실록』 헌종 7(1841)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