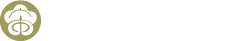|
사우당(四友堂) 효정공(孝貞公) 송국택(宋國澤)
(1597/선조 30∼1660/현종 1)
공의 휘는 국택이고, 자는 택지 호는 사우당이다.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인조 2년(1624)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에 등용되었고, 정묘호란 때 호소사 김장생의 막하로 있다가 천거 받아 검열이 되었다. 이어 정언 함길도 도사를 지냈다. 병자호란 때에는 함락된 강화도에서 원손을 탈출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그후 병조참지를 거쳐 형조 공조참의를 승지 예조참의 전주부윤을 지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효정의 시호를 받았다. 저술로 사우당집이 있다.
그는 15일에 회현방 우사에서 하세하였다. 연세가 63세이다. 부음을 듣고 위에서 놀라고 슬퍼하여 중사(中使)에게 호상을 명령하였다. 마지막 길을 측은히 여기는 예전이 대단히 융숭하였다. 처음에 공주 유성 남쪽 소홀리에 장례(1660.3.1)하였다가 계축년(1673.12. )에 유성현의 조교리 해향의 자리에 합폄하였다.
사제문(賜祭文)
1) 1660(현종 1)년 12월 6일에 상이 예관을 보내시어 고자(孤子)를 조문하시고 제를 지냈다. (예조정랑 윤형계가 와서 예를 시행하였다.) 상께서 1660년 2월에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홍문관 대제학 지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관(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의 증직(贈職)을 명하시었다.
2) 1696(숙종 22)년 : 임금이 외손 김석연을 보내 묘소에 치제하고, 사제문(賜祭文)을 내리다. 제문은 지제교 이정명이 초하여 올리다.
3) 1756(영조 32)년 11월 6일 : 예조정랑 윤면동(尹冕東)을 보내 치제(致祭) 하였다. 사제문(賜祭文)은 이의철(李宜哲)이 지었다.
…… 상략 …… 진실한 우리 경(卿)은 바로 성모(聖母)의 외조이심으로 왕후의 수레가 빛나고 황홀한 것을 경이 직접 보시었도다.
가문이 성하고 빛나매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서 전야(田野)의 낮은 관직으로 돌면서 산림(山林)의 덕을 닦는 선비들과 교의(交誼)를 맺고, 영예와 치욕을 도무지 잊고 지내어, 한 세상이 다 칭송하여 부러워하니 오직 경의 존양(存養)한 나를 여기에서 가히 증험하겠도다.
내가 자성(慈聖)을 받들어 뜻을 겉으로는 정성을 다하기를 생각하여 이미 이 마음 미루어 황비(皇妃) 외가에 미치었도다.
하물며 올해는 먼 옛날의 느낌이 더욱 간절하여 비풍하천(匪風下泉)의 생각이 높은 절개와 의리를 더욱 우러러 사모하도다.
이에 명하여 자손을 녹용(錄用)하고 달려가 존령(尊靈)에 강신하며 유식(侑食)을 하게 하나니 영혼이 있거든 이 술과 안주를 흠향할지어다.
4) 1756(영조 32)년 12월 21일
…… 상략 …… 먼 저번에 상(上)이 선생의 유문(遺文)과 묘지를 취해 보시고 그의 충절을 깊이 탄식하시었는데 마침 강화유수 이이명(李頤命)이 소(疏)를 올리어 충렬사(忠烈祠)에 사제(賜祭)하시기를 청하여, 상(上)이 허락하시고 인해 선생에게 아울러 치제 하라고 명하시어 이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강화유수 이이명의 소청사(疏請事)를 보니 실로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지라 그런고로 정축년 성이 함몰되었던 날로써 충렬사에 사제하기를 특별히 허락한다.
이 일로 인하여 별달리 감동한 바가 있으니 대개 우리 성모(聖母)의 외할아버님 증좌찬성 송모(宋某)가 이 해에 수립한 충절은 역시 숭보지전(崇報之典)이 가히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
내가 일찍이 송봉조하(宋奉朝賀 : 송시열)의 찬술한 찬성의 묘문 및 그의 스스로 저술한 모든 학문을 보니 그의 절개와 의리가 남송의 주변(朱弁)과 방불하게 서로 같으면서도 혹은 더 하였다.
…… 상략 …… 사제문에 이르기를 「오직 옛날 위공과 주변(朱弁)이 혹은 죽었고, 혹은 살았으나 본래 정한 마음이 같은 것은 내가 자양(紫陽 : 주희)에 들었노라. 하물며 경의 충절은 우연히 전벽(全壁)한 것이 비할 것이 아니요.
양후(楊后)가 죽기를 참은 것은 조씨의 일점혈육을 위한 것과 같았도다.
처음에는 통사(通使)로 간 것을 수치로 여기었고, 느지막이는 위호(僞號)를 배척하여 쓰지 아니하였는데, 화약을 취하여 죽기를 맹세하였으니 그의 잡은바 절개와 의리를 가히 보겠도다.
저 충렬사를 돌아보니 마침내 같은 절개와 의리를 돌아가네. 한 체제로 제(祭)를 지내어 숨은 의리를 천명하는 뜻을 붙이노라. 용문산(龍門山)의 기도한 글을 외우니 유지가 얽히어 있음을 알겠도다.
존령(尊靈)이 어둡지 아니하거든 흠향하소서!」
5) 1816(순조 16)년 : 임금이 예관 임천군수 이헌성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제문은 지제교 김학순이 초안해 올렸다.
6) 1876(고종 13)년 : 임금이 예관 공주판관 신석유(申錫游)를 보내 묘소에 치제하고 사손을 녹용토록 지시하다. 지제교 홍대중이 초안해 올렸다.
|
|
1860(철종 11)년 10월 : 시장(諡狀)이 이루어졌다. 좨주 금곡 송래희가 찬술하였다.
1871(고종 8)년 5월 : 효정으로 증시(贈諡)하였다. 태상시(太常寺 : 봉상시를 말한다. 제사 회의 시호를 등을 맡아보는 관청)에서 시(諡)를 의논하여 이르기를 「효정장민정민(孝貞莊敏貞敏)」이라고 하여 효정(孝貞)으로 비준(批准 : 신하가 올린 문건을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한 일)을 내리시니 자혜애친(慈惠愛親)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어버이를 사랑한 것을 효(孝)라 하고, 청백자수(淸白自守)는 맑고 곧으며 자기를 지킨 것을 정(貞)이라 한다. [『고종실록』 고종 8(1871)년 3월 16일]
임술년(1982.8.28.)에 부군의 택조(宅兆)가 시가에 편입되었으므로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곤좌간향지원(坤坐艮向之原)에 개폄(改窆)하였다.
경이직내 의이방외(敬以直內 義以方外)
「공경으로 속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르게 한다.」
이글은 주역의 곤괘 62에 있는 말이다. 사우당 효정공(국택)께서 사계 김장생선생을 사사하였는데, 사우당께서 평생 실행하여야 할 요언(要言)을 선생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대가 일찍이 주역을 읽었다고 들었는데, 주역에 있는 그 말은(표제어) 주자께서 학문하는 요점을 이 말 이외에 다른 말이 없다 ”고 했고, “또 만일 실제로 잡아 공부하는 데에 이 8자를 일생동안 사용하더라도 다하지 못하리라. ”고 하였다.
“옛사람이 불원복(不遠復 : 머지않아 회복됨) 8자부(字符)를 하여 생을 다하도록 복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움으로 행실을 바르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것이며, 또한 선조들의 추앙을 받을 것이며, 또한 선조들의 가언가행(嘉言嘉行)을 이어받았다고 할 것이다.
사우당 호의 유래
四友堂은 辛亥年(1971)에 중건
호의 유래(『국역 사우당집』 上 기해 10월 p196)
백헌 이상공 경석에게 드리는 답장 …… 또 아울러 당기문(堂記文)을 지어주신다는 쾌한 허락을 받았으니 매련국죽(梅蓮菊竹)이 그 꽃다움을 백세에 퍼뜨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四友가 더불어 벗으로 삼아 주는 사람이 어찌 영광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우당(四友堂)서문(『사우당집』 상 p356)
송촌 동쪽에 바위와 언덕과 냇물과 폭포의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이름은 비래동이라고 한다. 일찍이 동춘 우암 모든 일가와 더불어 작은 암자를 구성하여 여러 사람이 거주하며 학문을 강론하는 곳으로 하였다. 암자에서 수마장 되는 곳에 고요하고 궁벽한 하나의 구역을 얻으니 곧 당(堂)이 있는 곳이다. ……암자에 늙은 중이 있어 하루는 찾아와 말하기를 「이 집이 비록 길고 고요한 운치는 있으나 한 모퉁이에 치우쳐있으므로 흠절이 있는 것은 벗이 없는 것입니다.」 하거늘 주인(사우당)이 응답하기를 「당에 매화가 있으니 봄날의 벗이요, 못에 연못이 있으니 여름날의 벗이며, 뜰에 국화가 있으니 가을날의 벗이요, 뜰에 소나무가 있으니 겨울날의 벗인지라, 나의 소견으로는 사방사시에 가는 곳마다 벗이 아님이 없거늘 어찌 벗이 없다고 말하는가?」하니 늙은 중이 문득 손을 끼고 두드리며 갔다. 인해 당의 이름을 「사우당」이라고 하였다.
동춘께서 행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과 더불어 친족으로서는 비록 면복이 되었으나 어릴 때부터 늙기에 이르기까지 집을 맞대고 살아서 항상 형으로 섬기고 아우로 길러 주시었다. 제문에 말씀하시기를 남천북맥(南仟北陌)이란 말이 나온다. 「우리 마을 전체 어디가 종중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만은 오로지 집을 맞대고 전원에 살면서 정의가 아우와 형같이 남쪽 전원과 북쪽 들판에 한가히 지팡이 나막신으로 서로 오가며 쫓아 놀았으며, 또 형이 사산에 새로 지으신 집은 또한 아우의 조그만 집과 서로 바라보이니 매양 말씀하시기를 모년(暮年 : 만년)에 조용히 서로 사는 것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느냐?」 고 하였습니다.
우암이 묘지를 찬술하여 말하기를 「내가 동종지친으로써 팔 구세부터 동춘공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서 공을 쫓아 공부하였더니 흰머리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친한 정의는 변하지 아니하였다.」 또 제문에 말하기를 「공이 나를 경저로 찾아오시어 당기를 부탁하면서 인해 당이 있는 곳에 초수(草樹)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돌아갈 것이니 군도 역시 따라오라. 동천북맥(東仟北陌)에 서로 쫓아다니며 넉넉히 놀면서 남은 세월을 마치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하였다.
이전의 상길의 제문에 이르되 「병자 정축년에 의분이 북받쳐 슬퍼하고 한탄하며…… 청의 연호를 배척하며 벼슬을 버리고 종용(從容)이 의리에 나아가 명나라의 연력(年曆)을 안고 사산으로 돌아오시었도다. 나의 매화이고, 나의 연꽃이며, 나의 소나무고, 나의 국화로다. 오직 이것을 벗 인양 생각하시고……」
선생이 일찍이 당기를 우암 및 백헌 이상국에게 청하시었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거연히 돌아가시었고 스스로 서술하신 것도 반이나 결손 되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우선생이 일찍이 청에 굴욕 항복한 것을, 굴욕으로 이를 갈으시고 홀로 숭정의 연력(年曆)을 안고 청나라 오랑캐의 연호를 쓰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동래부로부터 파직되어 돌아오시어 모든 교제를 중지하고 「매연송국」에 정을 의탁하고 미가(薇歌 : 고비나물을 캐는 노래)와 菊史에 뜻을 부치시니, 일찍이 우옹이 또한 기문을 지으셨는데 원고가 반을 이루지 못하여 선생은 거연히 돌아가시고 유당(遺堂)만 홀로 서있어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리키면서 슬픈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