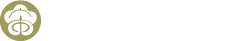인물정보
송명흠(宋明欽)
동춘당문정공파

늑천 송명흠(宋明欽) 묘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
늑천 문원공 송명흠(1705 : 숙종 31 ~ 1768 : 영조 44) 송명흠(송明欽)은 자가 회가(晦可)이고 시호는 문원(文元)이며 늑천(櫟泉)은 호이다. 동춘당(同春堂)의 현손이고 묵옹공(默翁公) 요좌(堯佐)의 자제로 1705년(숙종 31) 10월 21일에 한양(漢陽) 제생동(濟生洞)에서 태어났다.어려서부터 용모가 특이하여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말을 하였고, 돌 때 묵옹공이 무릎에 앉히고 문학을 가르쳐 주니 곧 이해 하고 잊지 않았다고 한다. 5~6세에 이미 효경(孝經), 논어(論語) 등을 모두 통달하니, 보 는 이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 이어 도암(陶庵)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

늑천 송명흠(宋明欽) 묘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
15세 때인 1721년(경종 1)에 사화(士禍)가 일어나자, 그것을 피하여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옥천(沃川), 도곡(塗谷), 종촌(宗村)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
송명흠은 기(氣)보다 이(理)를 더 중시하고 본연지성에 초점을 맞춰 경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은 송준길을 뿌리로 하는 가학(家學)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송명흠은 경을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상위의 가치이자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여겼다. 저서로는 『늑천집(櫟泉集)』, 『늑천소말조진(櫟泉疏末條陳) 』 등이 있다.
보통 4대조까지 조상의 신주와 기제사를 모시고, 4대가 지나면 사당 밖으로 천위(遷位)하는 것이 보통이나 공신(功臣) 등은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하여 옮기지 않고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나라에서 은전을 내렸는데, 은진송씨 문중에는 불천지위 선조가 송준길 문정공 · 송시영 충현공 · 송시열 문정공 · 송명흠 문원공의 네 사람이 있다. 1803(순조 3)년 증직(贈職)과 시호(諡號)를 내리는 명을 받았다.
9월 : 전직 대사헌 이직보가 상소하여 선생 및 미호 김원행과 지암 김양행을 포상하고 정려하는 일을 청했다.
대신이 회계(回啓 : 임금의 물음에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함)하여 청한대로 시행하였다.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성균관 제주 지의금부사 오위도총관(資憲大夫 吏曹判書 兼 成均館祭酒 知義禁府事 五衛都摠管)」의 증직을 내리셨고,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諡號)를 논의하라 명하시어, 1805(순조 5)년 「문원(文元 : 道德博聞曰文 主義行德曰元)」이라고 시호를 내리셨다.
1) 1796(丙辰 : 정조 20)년 12월 손자 계간(啓榦)이 벼슬을 받음으로 인해 가묘에 제사를 내려주라는 명을 받았다.
손자 계간이 대신의 추천으로 유생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들어 왕을 알현하였고, 동몽교관(童蒙敎官)에 부쳐졌다.
임금이 하교하시기를 “지난 계미년에 고 찬선(贊善 : 송명흠)이 올라왔을 때 내가 귀한 손님의 예로 보기를 청했으나, 찬선이 겸손하게 사양하여 내게 힘써 말한 후에 받아들였다.
내게 서연(書筵)에 올라와서는 내 자질에 보탬이 되어 그 손자를 보니 그가 보존하고 있는 바를 두드려 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막 바로 그 모습을 접해도 곧 좋은 선비임을 알 수 있겠으니, 선정(先正)의 집안에 매우 다행이로다.
내가 옛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그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니, 고(故) 찬선 송명흠의 집에 관원을 보내 제사를 올리게 하노라” 하셨다.
사제문(賜祭文)에 이르기를
“효종임금 시대에 문정공이 계셨네.
덕이 같고 마음이 한결같으니 대의(大義)를 잡으셨네.
위태롭고 은미함을 강론하심이 원수를 갚는 계책이었네.
임금과 신하사이 쇄락하니 천년의 융성한 시대이네.
…… 중략 ……
내 어릴 적 기억컨대 빈객으로 뵙기를 청했네.
겸손하고 사양함이 누차에 해가 기울어 전각을 지나갔네.
이에 순수한 얼굴을 보니 한 덩어리 온화한 봄이었네.
굳세고 굳센 아름다운 가르침은 보탬이 되어 크게 좋아짐이 있었네.
그 후 남은 삼십년 덕의(德義)가 무성하네.
어찌 하였기에 유학의 교화가 이리 널리 퍼졌을꼬.
그대가 남긴 후손을 불러 옛 생각을 마음에 두어
시와 서가 있는 고택에 관원을 보내 술잔을 올리노라.”
라고 하였다.
후일 정조가 경연 중에 누차 교시를 내려 이르시기를 “근세 유생들을 내가 모두 보았으나 송찬선(송명흠)의 풍의(風儀)와 기상(氣像)이 제일 존경할 만하다.
다른 자들은 멀어서 미치지 못한다. 조정에 나오는 유생들은 바로 이때 말해야 할 일이 있어도 다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송찬선은 능히 다 말할 수 있었다.
또 그중에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다.”라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