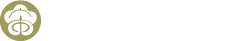|
당시 심성(心性)의 변(辨)으로 성리학계에서 논쟁을 벌일 때 한원진(韓元震)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송환기는 학덕을 겸비하여 조야의 존경을 받았으며, 문하에 많은 선비가 모여들었다. 저서로는 『성담집(性潭集)』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07(순조 7)년 8월 5일 : 감사 조덕윤(趙德潤)이 우찬성 송환기(宋煥箕)가 졸(卒)하였다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노인의 신절(愼節)088) 이 아무리 오래 끈다고는 하나 정력의 강건함이 젊은이와 다름이 없어서 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 자담하며 회복되는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의원이 돌아온 지 오래지 않아 뜻하지 않게도 흉음(凶音)이 갑자기 닥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고 찬성(贊成)은 곧 선정(先正)의 후손이고 소자(小子)의 스승이었다.
학문과 덕망을 조야(朝夜)에서 존숭하는 바였는데, 갑자기 졸서하였음을 들었으니, 어찌 그 슬픔을 견딜 수 있으랴? 은권(恩眷)이 두터웠음은 선조(先朝) 때부터 각별하였고, 경신년(1800)의 봄과 겨울에 몇 차례 조정에 나아왔는데, 유현(儒賢)의 예로써 대우함에는 더욱 사체가 평소에 무거움이 있었다.
졸한 우찬성 송환기에 대해 조제(弔祭)와 치부(致賻)를 해조(該曹)에서 거행하고, 장례 때 소용되는 바를 도백(道伯)은 넉넉히 보내어 저치미(儲置米)로써 회감(會減)하여, 모두 특별히 뜻을 기울여서 호상(護喪)토록 하라. 그리고 따로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겠노라. 그 사손(嗣孫)은 복(服)이 끝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토록 하라."하였다.
임금이 듣고 슬퍼하며 특별히 승지를 파견하여 제사지내고 지제교(知製敎) 안정선(安廷善)을 보내 사제문(賜祭文)을 내리다.
1811(순조 11)년 6월 19일 : 시장(諡狀)없이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시망(諡望)에 대한 비답을 내렸는데, 증 좌의정 임광(任絖)에게는 충간(忠簡)으로, 우의정 박종악(朴宗岳)에 충헌(忠憲)으로, 우찬성 송환기(宋煥箕)에게는 「문경(文敬)」으로, 증 이조 판서 이간(李柬)에게는 문정(文正)으로 시호를 내렸다.
문경(文敬)의 의미는 문(文)은 도덕이 있고 널리 들은 것이 많으니 도덕박문(道德博聞)이고, 경(敬)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언행을 조심한다. 의 숙야주계(夙夜做戒)이다.[『순조실록』 순조 11(1811)년 6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