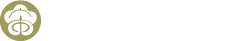인물정보
송상기(宋相琦)
제월당문희공파

옥오재(玉吾齋) 문정공(文貞公) 송상기(宋相琦)) 묘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
옥오재(玉吾齋) 문정공(文貞公) 송상기(宋相琦) 경종 3년 6월 1일 원임(原任) 이조 판서(吏曹判書) 송상기(宋相琦)가 강진(康津)에서 졸(卒)하였다. 송상기(宋相琦)의 자(字)는 옥여(玉汝)이고 은진인(恩津人)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 송규렴(宋奎濂)의 아들이다. 신축년(1721년) 겨울 조태구(趙泰耉)가 왕대비(王大妃)의 언문 교서(敎書)를 봉환(封還)시킬 때를 당하여 송상기가 병조 판서(兵曹判書)로서 소장을 올리기를, |

옥오재(玉吾齋) 문정공(文貞公) 송상기(宋相琦)) 신도비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
이리하여 조태구가 이에 소장을 올려 송상기가 자전의 뜻을 속였다고 하면서 강진현(康津縣)에 찬배시켰다.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卒)하니, 나이 67세였다. 송상기는 글을 짓는데 즉석(卽席)에서 이룬 것이 많았으므로 관각(館閣)의 제공(諸公)들이 모두 말하기를, ‘옥여(玉汝)080) 의 민첩함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
생각건대 그대의 학문 연원은 거슬러 올라가 알 수 있으니 시(詩)와 예(禮)에 대한 가르침을 가정에서 받았고, 집에서 나와 스승을 구해 독실한 자세로 학문을 끝까지 궁구(窮究)하였다. 직접 지도하여 더 발전하게 이끌어 준 두 선정(先正)이 있었으니 도의 정신을 내면에 온축(蘊蓄)하여 아름다운 기상이 밖으로 더욱 밝게 빛났다. …중략… 세 번 대제학이 되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북쪽의 기고관이 되어서는 문장이 더욱 빛났다.
아홉 번 이조판서가 되어 정계를 맑게 하니 사사로운 청탁이 끊어지고 인사 평가를 반드시 공평하게 하였다. …중략… 오랜 덕망을 지닌 한 두 사람은 의정부에 올랐는데 그대만 홀로 돌아갔으니 저승에서 불러올 수 없게 되었다.
하늘은 어찌 그대를 남겨두어 즉위 초기에 나를 돕게 하지 않았단 말인가. 조정에 돌아와 보니 감회의 눈물 떨어진다.
이에 본래의 관작을 회복하여 저승의 넋을 위로하노라. 제문을 짓고 제관을 보내 나의 애통한 마음을 영전에 고하게 하니 밝은 영이 있거든 이 제물을 받으라.”
이에 예관을 보내 대신 하찮은 예물 올리게 하니 영령이여 어둡지 않다면 흠향하시길.
2) 1774(영조 50)년 2월 4일 : 예조좌랑 문형중(文衡中)을 보내 제문을 내려주어 생전의 업적을 치하했다. 송상기 사후 51년의 일이다.
1747(영조 23)년 : 문정(文貞)의 시호가 내려졌다. 시호의 의미는 문(文)은 근학호문(勤學好問) 즉 부지런히 배움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했으며, 정(貞)은 청백수절(淸白守節) 한 것을 정(貞)이라 하는데, 청렴하고 결백하게 절의를 지켰다는 뜻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23(1747)년 8월 9일]